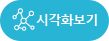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0302430 |
|---|---|
| 한자 | 厄- |
| 영어음역 | aengnaegi |
| 영어의미역 | evil-expelling ritual |
| 이칭/별칭 | 액막이,액방 |
| 분야 | 생활·민속/민속 |
| 유형 | 의례/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|
| 지역 | 강원도 강릉시 |
| 집필자 | 장정룡 |
| 성격 | 민간신앙 |
|---|---|
| 의례시기/일시 | 음력 정월 대보름날 |
[정의]
정월 대보름날에 자신에게 들어 있는 나쁜 재액을 막기 위해 행하는 신앙행위.
[개설]
액매기 풍습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강가에서 행하는 주부들의 어부식 액막이, 바닷가에서 행해지는 무당의 용왕제 물치성, 농악대의 우물고사반, 뗏목꾼의 강치성 등이 있다. 그 방식은 축문형과 고축형, 기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.
[명칭유래]
액매기는 액막이 즉 액방(厄防)의 의미다. 그것은 골매기가 골막이로 곡방(谷防)으로, 산매기가 산의 재앙을 막는 산방(山防)과도 같은 유래이다.
[연원]
1921년 최영년이 저술한 『해동죽지(海東竹枝)』에는 살어식(撒魚食)이라 하여 “옛 풍속에 정월 보름날에 조밥을 우물 샘에 살포하여 고기더러 먹으라는 뜻을 붙인다. 이것을 어부식(魚付食)이라고 한다”라고 하였으며 “집집이 조밥은 무엇 하는 것인가/물직성 가진 사람 사시하기를 좋아한다/옛 우물에 고기 없건만 밥을 뿌리니/차라리 천하로 방생지를 파게 함이 어떠리”라는 시가 기록되어 있다.
[절차]
정초에 물직성이 든 사람이 강릉 남대천 가에서 조밥을 물에 던져 액을 막는다고 믿는다. 강릉 어촌에서는 흰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, 밥 세 접시를 싸서 물 속에 던진다. 안목마을에서는 9 또는 7이 든 나이의 사람은 신수가 불길하다 하여 어부식을 한다. 오곡밥을 숟가락으로 뜨는데 자신의 나이 수대로 하여 한지에 싼 다음 바다에 던져 넣고 달을 향해 무사하기를 빌며 절을 한다. 강동면 안인진리에서는 14일 밤에 백지를 조끼처럼 잘라서 그 조끼의 동쪽에 ‘해동 조선국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거 모씨 금년 신수방액(海東 朝鮮國 江原道 江陵市 江東面 安仁居 某氏 今年 身數防厄)’이라고 써서 입고 하룻밤을 잔다. 다음날 약밥을 세 숟가락 떠서 대보름달이 뜰 때 달을 향하여 “아무개 금년수 방액”이라고 세 번 부르고 나서 바다에 던진 뒤 달을 향하여 두 번 절한다. 또한 용왕 궁전 고기들에게 “액매기요”라고 외치며 바다에 던진다. 금진마을에서도 ‘어부식’이라 하여 오곡밥을 나이대로 떠서 한지에 잘 싸서 바다에 넣고 달을 보고 절을 하며 한 해의 무사함을 빈다. 학산농촌마을에서는 토정비결을 보아 신수가 나쁘다고 나온 사람은 짚으로 ‘제용’이라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며칠간 베개로 삼아 베다가 대보름날 길에 버려 그 액을 막는다.
- 최영년, 『해동죽지』(장학사, 1925)
- 장정룡, 『강릉의 민속문화』(대신출판사, 199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