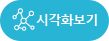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0303972 |
|---|---|
| 한자 | 鄕會 |
| 영어음역 | hyanghoe |
| 영어의미역 | village assembly |
| 분야 | 종교/유교 |
| 유형 | 개념 용어/개념 용어(일반) |
| 지역 | 강원도 강릉시 |
| 집필자 | 이규대 |
[정의]
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회의체.
[개설]
‘향회(鄕會)’에서 ‘향(鄕)’은 1개의 관읍을 상징한다. 따라서 향회는 군현(郡縣)단위에서 공론을 수렴하는 회의체이다. 향회는 조선전기부터 군현단위에서 시행된 향규(鄕規), 향약(鄕約) 등에서 운영되었으며, 조선후기 면리제(面里制) 하에서 운영된 면회(面會), 동회(洞會), 리회(里會)와 비교될 수 있다.
[구성]
강릉 지역에서 1600년(선조 33)에 시행되었던 향규(鄕規)에서 향회가 회의체로서 운영되었음을 살필 수 있으며, 시기를 소급한다면 조선 초기에 소실된 강릉향교를 건립하기 위해 여론이 수렴되고 있었던 데서 향회가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. 이 시기에 향회는 지역사회에 일정하게 세력기반을 가졌던 재지사족들로 구성되었고, 이들 구성원들의 명부인 향안(鄕案)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. 향안에 등재된 인물은 이 지역의 치향지인(治鄕之人)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.
[개최장소와 운영]
향회는 시의에 맞추어 정해질 수 있었지만 대개는 유향소(留鄕所), 향청(鄕廳), 사마소(司馬所), 향교(鄕校) 등이 개최장소로 이용되었고, 회의의 운영은 유향소의 좌장인 좌수(座首)가 주관하였다.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원들의 참여가 강요되는 바가 없지 않았다. 즉 회의 구성원인 향원(鄕員)들의 실행(失行)과 회의 불참자에 대한 징계규정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.
[변천]
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향회의 모습이 변모되어 갔다.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인하여 기존의 구성원 즉 구향(舊鄕)에 대비되는 새로운 세력인 이른바 신향(新鄕)이 향안에 등재되고 향회에 동참함으로써 이른바 신구향간에 갈등이 빈발하였다. 이러한 과정에서 공론의 수렴은 쉽지 않았다. 이렇게 재지사족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못함으로써 향회는 그 기능이 한정되어 갔으며, 상대적으로 수령권이 강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.
[의의와 평가]
향회에서 수렴된 공론은 명실상부한 지역의 공론으로 대표성을 가졌다. 이 공론은 지역 사회에서 회의구성원은 물론 일반 하층민들을 구속하였고, 중앙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령과 협조적이면서 압박하는 이른바 길항과 유착관계의 성향을 띠고 있었다.
- 정은경, 「1894년 강릉부에서의 향회운영과 참여세력의 동향」(『동대사학』1, 동덕여대 국사학과, 1995)